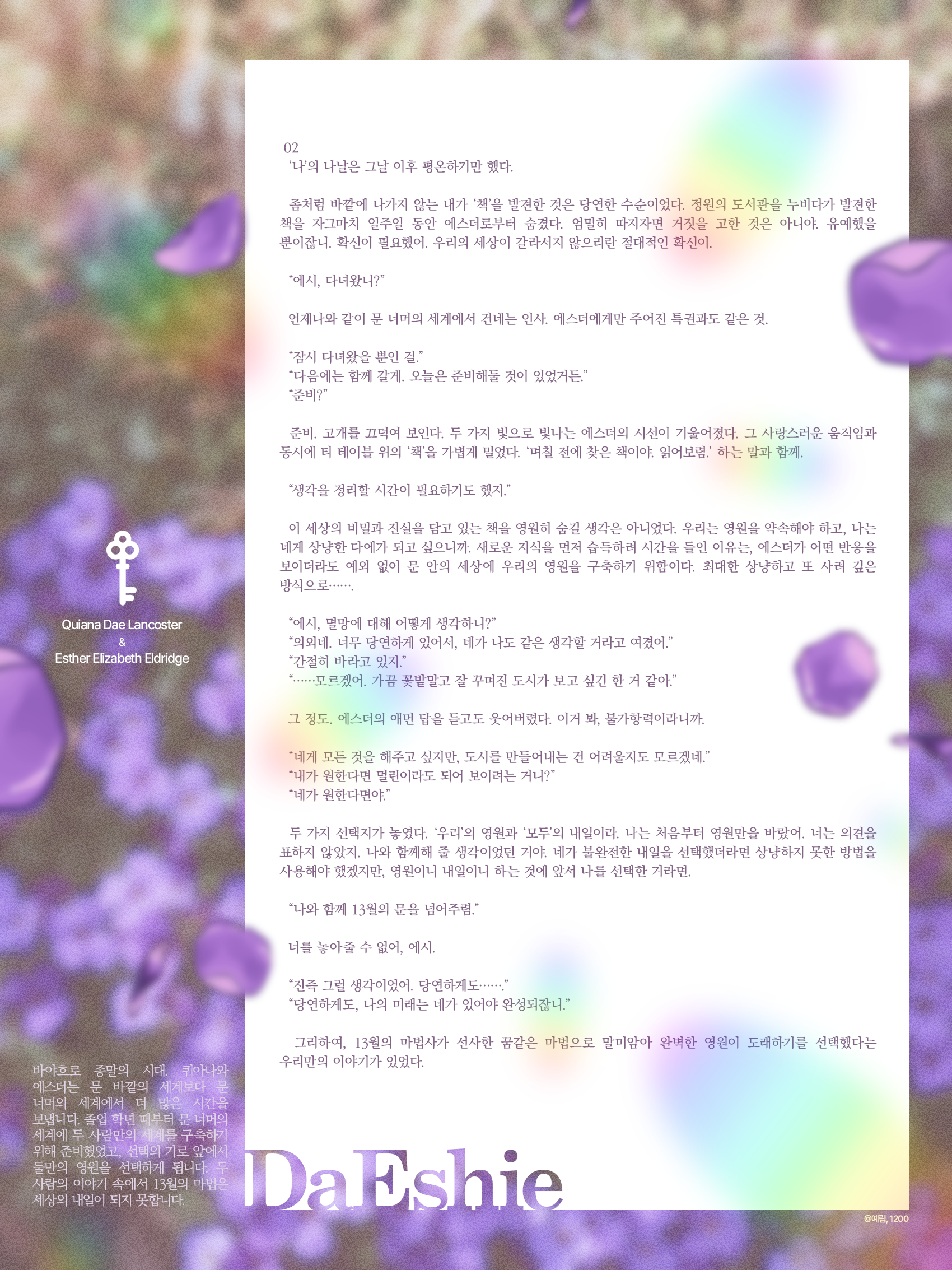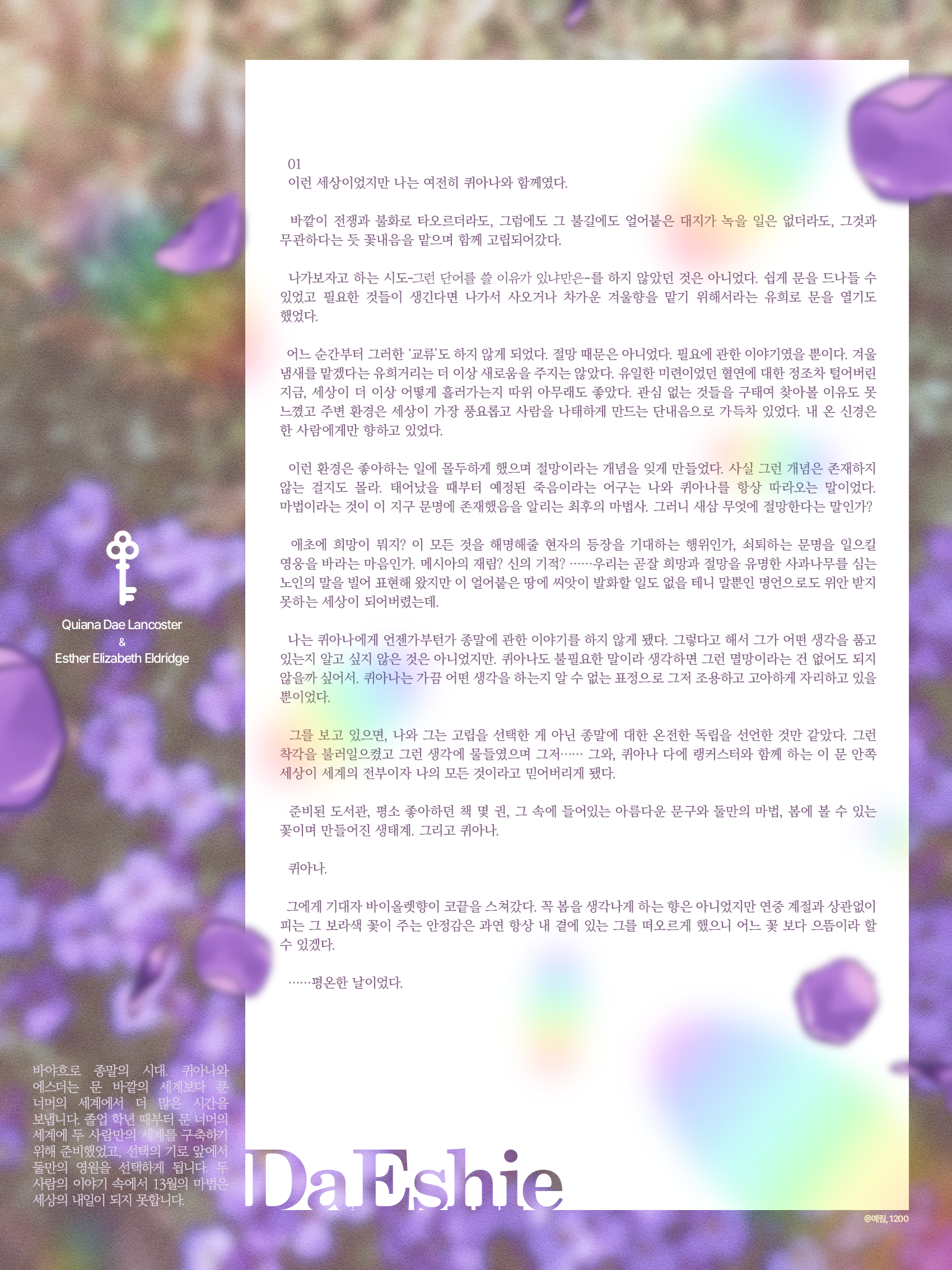
01
이런 세상이었지만 나는 여전히 퀴아나와 함께였다.
바깥이 전쟁과 불화로 타오르더라도, 그럼에도 그 불길에도 얼어붙은 대지가 녹을 일은 없더라도, 그것과 무관하다는 듯 꽃내음을 맡으며 함께 고립되어갔다.
나가보자고 하는 시도-그런 단어를 쓸 이유가 있냐만은-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쉽게 문을 드나들 수 있었고 필요한 것들이 생긴다면 나가서 사오거나 차가운 겨울향을 맡기 위해서라는 유희로 문을 열기도 했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교류’도 하지 않게 되었다. 절망 때문은 아니었다. 필요에 관한 이야기였을 뿐이다. 겨울 냄새를 맡겠다는 유희거리는 더 이상 새로움을 주지는 않았다. 유일한 미련이었던 혈연에 대한 정조차 털어버린 지금, 세상이 더 이상 어떻게 흘러가는지 따위 아무래도 좋았다. 관심 없는 것들을 구태여 찾아볼 이유도 못 느꼈고 주변 환경은 세상이 가장 풍요롭고 사람을 나태하게 만드는 단내음으로 가득차 있었다. 내 온 신경은 한 사람에게만 향하고 있었다.
이런 환경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게 했으며 절망이라는 개념을 잊게 만들었다. 사실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걸지도 몰라. 태어났을 때부터 예정된 죽음이라는 어구는 나와 퀴아나를 항상 따라오는 말이었다. 마법이라는 것이 이 지구 문명에 존재했음을 알리는 최후의 마법사. 그러니 새삼 무엇에 절망한다는 말인가?
애초에 희망이 뭐지? 이 모든 것을 해명해줄 현자의 등장을 기대하는 행위인가, 쇠퇴하는 문명을 일으킬 영웅을 바라는 마음인가. 메시아의 재림? 신의 기적? ……우리는 곧잘 희망과 절망을 유명한 사과나무를 심는 노인의 말을 빌어 표현해 왔지만 이 얼어붙은 땅에 씨앗이 발화할 일도 없을 테니 말뿐인 명언으로도 위안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나는 퀴아나에게 언젠가부턴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퀴아나도 불필요한 말이라 생각하면 그런 멸망이라는 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퀴아나는 가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저 조용하고 고아하게 자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를 보고 있으면, 나와 그는 고립을 선택한 게 아닌 종말에 대한 온전한 독립을 선언한 것만 같았다.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그런 생각에 물들였으며 그저…… 그와, 퀴아나 다에 랭커스터와 함께 하는 이 문 안쪽 세상이 세계의 전부이자 나의 모든 것이라고 믿어버리게 됐다.
준비된 도서관, 평소 좋아하던 책 몇 권, 그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문구와 둘만의 마법, 봄에 볼 수 있는 꽃이며 만들어진 생태계. 그리고 퀴아나.
퀴아나.
그에게 기대자 바이올렛향이 코끝을 스쳐갔다. 꼭 봄을 생각나게 하는 향은 아니었지만 연중 계절과 상관없이 피는 그 보라색 꽃이 주는 안정감은 과연 항상 내 곁에 있는 그를 떠오르게 했으니 어느 꽃 보다 으뜸이라 할 수 있겠다.
……평온한 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