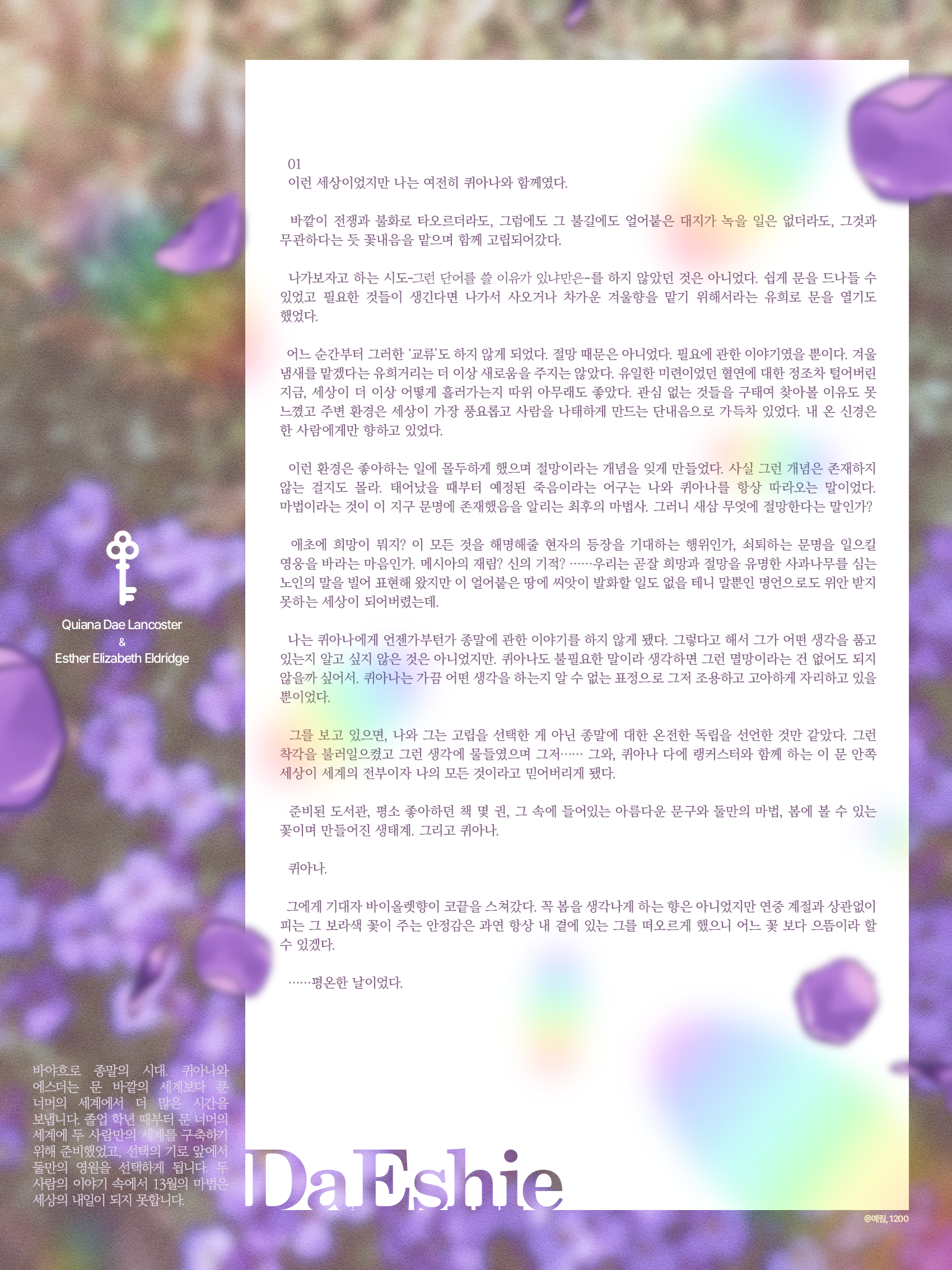07
야속한 시간은 탄생과 죽음의 세대를 기어코 졸업 학년까지 키워냈다.
퀴아나 랭커스터는 말했다. “호그와트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어. 우리 세계의 평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니, 전제부터 틀리지 않았니.” 반면, 에스더 엘드릿지는 말했다. “왜? 그래도 난 너랑 같이 있을 자리를 준 것만으로도 호그와트의 최선은 인정하는 편인데.”
두 사람에게 지난 날은 기회의 시간이었다. 어느 봄날 운명과 같은 만연한 봄의 ‘문’을 발견한 이후, 두 사람만의 세계를 가꾸는 데에 열중이었으니. 퀴아나는 자신뿐이었던 세계에 룸메이트인 에스더를 받아들였다. 에스더는 퀴아나의 편애를 기껍게 느꼈다. 비로소 두 사람의 관계가 균형을 이뤘다.
죽어가는 세계에 남은 계절이 둘뿐일지라도 문을 열고 들어서기만 하면 언제든 두 사람만의 세계가 펼쳐졌다. 날이면 날마다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날 즈음 문을 열었다. 특히 퀴아나는 ‘바깥 세계’에 대한 희망을 버렸으니 문 너머의 세계가 각별했다.
“에시, 그곳은 우리의 세계야. 우리밖에 없다는 뜻이지.”
“하지만, 다에…….”
“우리가 가꾸지 않으면 바깥 세계처럼 죽어버리고 말 걸.”
말과 함께 뻗은 퀴아나의 새하얀 손을 외면하지 못한 에스더와 언제나 함께.
08
지난 육 년 간 마법 세계와 비마법 세계는 멸망을 피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지만, 우리의 존재가 탄생과 죽음의 멸망을 증명했다. 우리 세대가 태어났다는 건 어쩌면 멸망할 준비가 됐다는 세계의 뜻이 아니었을까.
두 사람의 요람이었던 마법 세계 또한 서서히 죽음의 운명에 휘말려 갔다. 어제의 기운은 오늘의 것보다 한참 낮았고, 어떤 마법으로도 잃어버린 계절은 되찾을 수 없었다. 그야말로 얄궂은 운명에 무력하게 휘말리는 꼴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마법사들은 누구보다도 운명을 사랑한다.
랭커스터 집안은 사랑하는 운명을 받아들이다 못해 운명론자의 선두가 되어 앞장섰다. 이 세대를 충분히 즐겨야 한다며 주장했다. 판 치는 사이비나 폭동과는 무관한 행보였지만, 입학 전부터 의견 충돌이 잦기도 했던 터라 퀴아나는 마지막 방학을 기점으로 집안과 연을 끊었다.
에스더는 여전히 엘드릿지에 대해 남은 미련을 보이기야 했지만……. ‘엘드릿지’가 예언자 일보와 사람들의 입담에서 소식이 끊기게 된 후부터, 거대한 천장마법과 담을 두르고 성씨를 공유한 그들끼리만의 안락함을 만들고자 했으니, 거기에서 벗어난 에스더가 찾은 둥지란 퀴아나의 옆자리 밖에 더 될까. 운명을 받아들여 작은 울타리를 만드는 습성은 비슷하기야 했다.
그러나 우리만은 죽음의 운명이 아닌 탄생의 운명을 타고났다. ‘13월의 문’의 세계를 빌어 멸망으로부터 유리된 것도 벌써 육 년 전의 일이다.
09
‘13월의 문’이 무엇인가. 문 너머는 어떤 세계인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문 너머를 드나들었지만 졸업 학년이 된 지금까지도 밝혀내지 못했다. 너머 세계의 규모는 두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호그와트 측에서 최선을 다해 보장한 일상 시간 외 남는 시간을 전부 할애해 탐방했으나 현재의 진도가 최선이었다.
‘문’의 존재에 대한 수많은 담론을 나눴다. 각자의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도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다. 에스더가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가 졸업해 호그와트를 떠나거든 다시는 ‘13월의 문’을 드나들지 못하는 걸까? 퀴아나는 답했다. 만약 그렇다면 졸업식 날 문을 넘어가 영영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떠냐고.
오직 우리에게만 존재를 허락하는 세계잖아.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세계인 거야.
마치 운명처럼.
첫눈에 알아봤지?
10
다른 기숙사에 비해 고요한 분위기의 슬리데린 기숙사 휴게실에도 작은 소란이 일었다. 곧 졸업 프롬이 열린다는 소식이었다. 파트너는 구했는지, 춤 연습은 충분히 했는지, 복장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에시.”
“…….”
“에시?”
무심코 학생들의 ‘프롬 이야기’에 귀 기울이던 에스더의 시선이 급하게 돌아오면 퀴아나의 손길이 따라붙었다. 하얀 장갑 착용한 손끝이 턱을 가볍게 짚어 고정시킨다.
“부, 불렀니?”
“그다지 흥미로운 얘기도 아니었는데.”
가벼운 타박에 입술이 절로 비죽 튀어나왔다.
“한 번 뿐인 파티잖니. 프롬 파티란 말이야.”
“사람 많은 건 질색이야. 다 같이 빙글빙글 도는 행위라면 더군다나.”
“낭만이라곤 없구나, 다에.”
다정한 손길을 피해 고개를 돌리던 에스더가 눈을 키우며 덧붙였다. “그럼, 프롬 때 연회장에 가지도 않을 셈이니?” 잘게 찡그려진 미간과 홍조 발그레 오른 두 뺨을 훑어보던 퀴아나는 천천히 답했다.
“글쎄.”
“네 대답은 늘 애매하고 변덕스러워.”
“고민 중이야.
“고민 중이라면?”
“어수선한 파티의 일원이 될 생각은 없었지만 푸른 꽃 꽂은 네 모습은 보고 싶어졌거든.”
“흥.”
내가 순순히 보여줄 줄 알고. 그제야 비죽 나왔던 입술이 모로 돌아간다. 얘 좀 봐. 퀴아나가 숨을 죽여 웃었다. 나랑 함께 가고 싶어 하는 거 알아. 이렇게 티를 내주니 먼저 물어보는 것은 내 쪽이어야겠지. 그래도 당장 물어볼 수는 없어.
낭만이라곤 모르는 퀴아나도 에스더가 낭만적인 것을 꽤 좋아한다는 것은 알았다. 그러니 네가 좋아하는 낭만을 충분히 준비해야 했다.